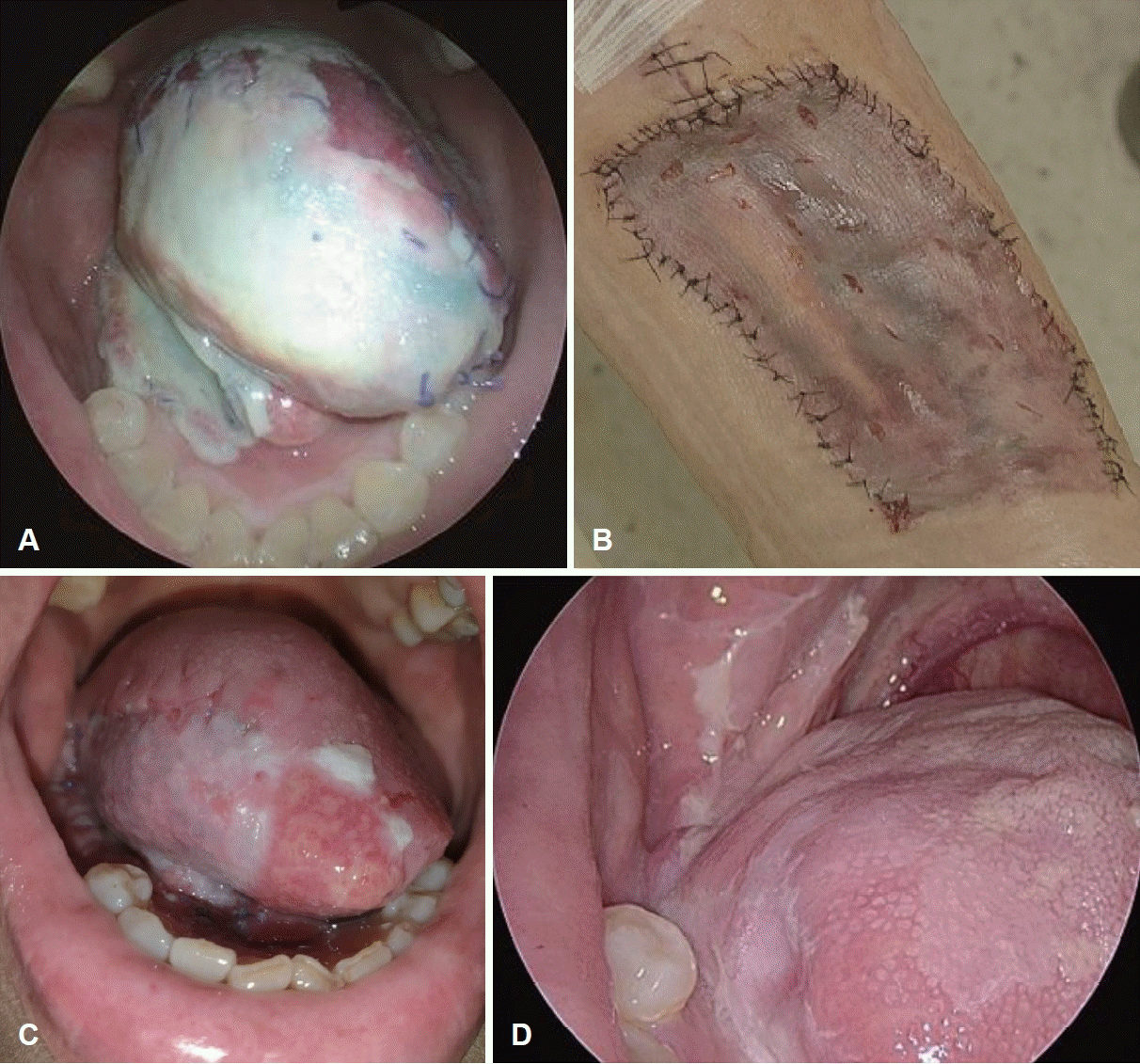탈상피화 요전완 유리피판을 이용한 구강암 수술 후 재건 2예
Two Cases of Reconstruction After Oral Cancer Surgery Using Deepithelialized Radial Forearm Free Flap
Article information
Trans Abstract
Radial forearm free flap (RFFF) is a workhorse free flap for intraoral reconstruction. However, the donor site of the forearm must be covered with skin grafts from other areas, which may cause additional problems such as pain, scarring, and infection at the skin graft donor site.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de-epithelialized RFFF has been attempted, and good reconstruction results with fewer complications have been reported. We report here two cases of successful reconstruction following oral cavity cancer surgery using de-epithelialized RFFF.
서 론
요전완 유리피판(radial forearm free flap, RFFF)은 두경부암 절제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결손 부위의 재건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술식이다[1]. RFFF는 적당한 두께의 연조직을 가지고 있고, 수여부 혈관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연조직을 절제하더라도 전완부의 기능적 장해가 많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두경부 중 특히 구강의 재건에 자주 사용된다[2]. 하지만 전완부는 유리피판의 절제 후 대부분의 경우에 일차봉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혜부나 기타 부위에서 전층(full-thickness) 혹은 부분층 피부이식(split-thickness skin graft, STSG)을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해 피부이식 공여부의 통증, 흉터, 감염 등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3].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STSG를 새로운 공여부에서 채취하는 것이 아닌, RFFF를 채취할 부위에서 STSG를 미리 채취한 후 결손부위에 다시 그대로 덮는 방식의 탈상피화(de-epithelialized) RFFF가 시도되었고, 다른 신체 부위의 피부이식 공여부의 합병증없이 좋은 재건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1,4-6]. 다만 국내 문헌에서는 이러한 증례가 아직 보고된 적이 없기에, 저자들은 탈상피화 RFFF를 이용하여 구강암 수술 후 결손부위의 재건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2예를 보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증된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2023-11-041).
증 례
증례 1
58세 여환이 혀의 종물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이학적 검사상 혀의 우측 복부(ventral portion)에서 구강저(floor of mouth)에 걸쳐 종물이 관찰되었고, 수술 전 조직검사상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되었다. 수술 전 경부 전산화단층촬영(CT) 및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상 혀의 우측 복부에 약 1.8×0.7 cm 크기의 조영증강되는 종괴가 관찰되었으며, 주위골 침범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술 전 양전자방출단층촬영-전산화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CT, PET-CT) 상 혀의 우측 복부와 구강저에서 국소적으로 F18-플루오로데옥시글루코스(fluorodeoxyglucose, FDG) 섭취가 증가되어 있었고, 우측 경부 II, III, V 구역(level)에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었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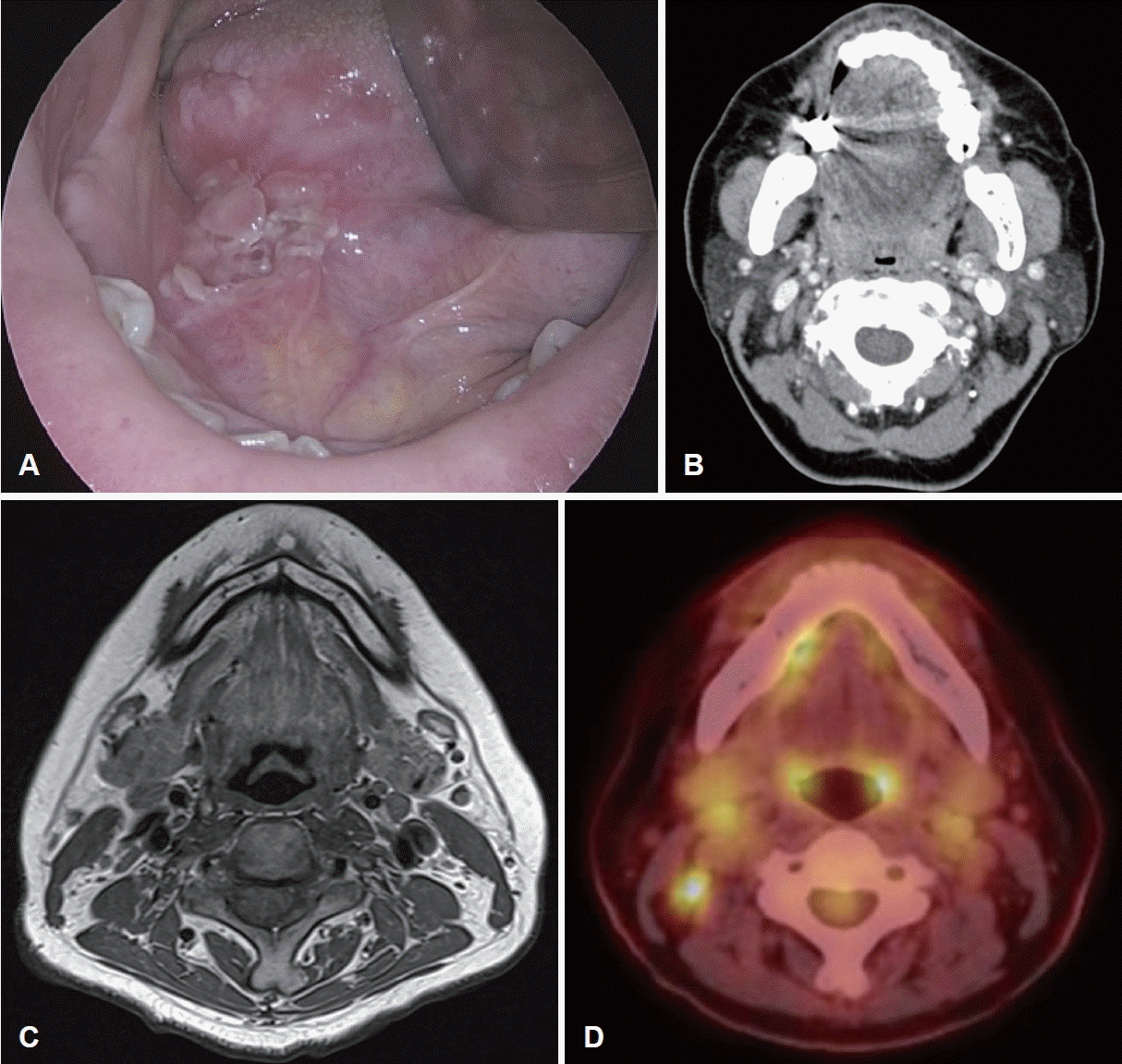
Preoperative evaluation of case 1. A: Preoperative endoscopic examination revealed a mass involving the right ventral portion of the tongue and extending to the floor of the mouth. B and C: Preoperative neck CT and MRI showed a contrast-enhancing mass measuring approximately 1.8×0.7 cm in the right ventral portion of the tongue, with no evidence of adjacent bone invasion. D: Preoperative positron emission tomography-CT demonstrated increased fluorodeoxyglucose uptake in the right ventral portion of the tongue and the floor of the mouth. Suspected lymph node metastases were observed in the right neck level II, III, and V.
이에 설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우선 혀의 종물을 안전역(safety margin) 1.5 cm를 확보하면서 완전히 절제하였고, 동결절편생검(frozen section biopsy)상 절제연에서 종양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우측 제3형 변형 근치 경부절제술(modified radical neck dissection)을 시행하였다. 이어서 좌측 전완부에서 피부절제기(dermatome, Zimmer)로 크기 약 5.1×6 cm, 두께 12/1000 inch의 원위부 기반(distal-based) STSG를 거상하였다. 그리고 동일 부위에서 탈상피화 RFFF를 채취하였고, 전완부의 결손 부위에 거상했던 피부 피판을 다시 덮은 후 압박 드레싱(dressing)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혀 및 구강저의 결손부위를 RFFF를 이용하여 재건한 후, 술후 출혈 방지를 위해 RFFF의 표면에 NeoveilⓇ (Gunze)을 덮고 수술을 마쳤다(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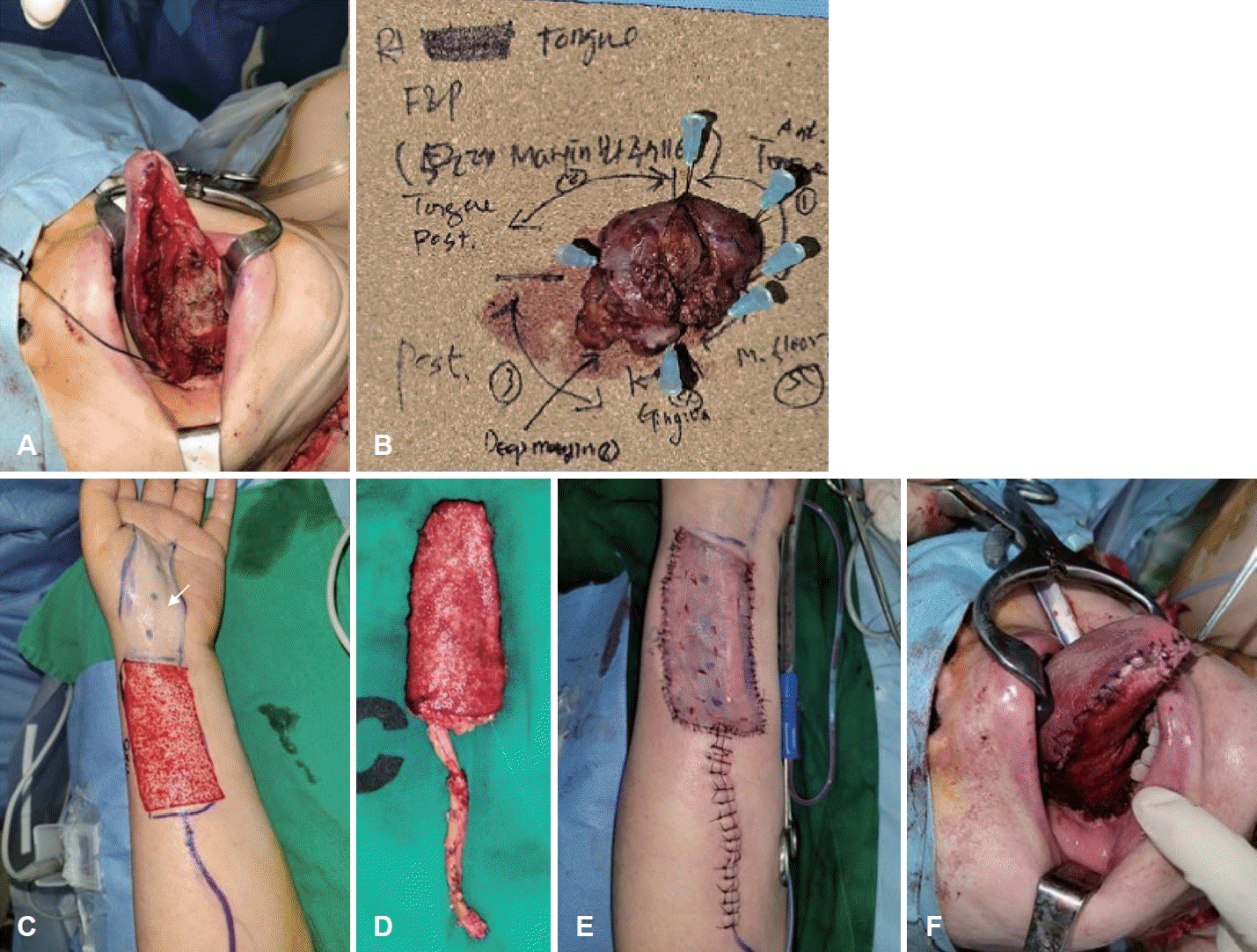
Intraoperative photo of case 1. A and B: The tongue mass was resected while securing a safety margin of 1.5 cm, and a frozen section biopsy confirmed that the resection margin was clear. C: A distal-based split-thickness skin graft (arrow) was lifted from the left forearm. D and E: After harvesting the radial forearm free flap (RFFF) from the forearm, the split-thickness skin graft was covered again and the incision was sutured. F: Defects of the tongue and floor of the mouth were reconstructed with RFFF.
조직병리검사상 저분화(poorly differentiated) 편평상피세포암(squamous cell carcinoma)이 진단되었고, 크기는 3×2 cm, 침윤 깊이(depth of invasion, DOI) 2.5 mm로 T2에 해당하였다. 절제연, 신경주위(perineural), 림프혈관(lymphovascular) 침범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부 IA, IIA, III 구역에서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었고, 림프절외 확장(extranodal extension)이 동반되어 N3b에 해당하였다. 이에 수술 후(adjuvant) 동시 항암방사선치료(concurrent chemoradiotherapy)를 시행하였다. 방사선치료(radiation therapy)는 6주간 27회에 걸쳐 총 5940 cGy를 조사하였으며, 시스플라틴(cisplatin, cisdiamminedichloroplatinum)을 이용한 항암화학요법(chemotherapy)을 2회 시행하였다. 수술 후 2년 8개월의 경과관찰 동안 재발 및 합병증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Fig. 3).
증례 2
58세 여환이 타병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상 구강의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되어 의뢰되었다. 이학적 검사상 좌측 하악 대구치 주변 치은에 압통을 동반한 궤양성 병변이 관찰되었다. 수술 전 경부 CT 및 MRI상 좌측 하악에 약 2.5×0.5 cm 크기의 조영증강되는 병변이 관찰되었으며, 하악골 침범이나 경부 림프절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수술 전 PET-CT상 좌측 하악에서 F18-FDG 섭취가 최대표준섭취계수(maximal standardized uptake value) 7.9로 증가되어 있었고, 이외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은 없었다(Fi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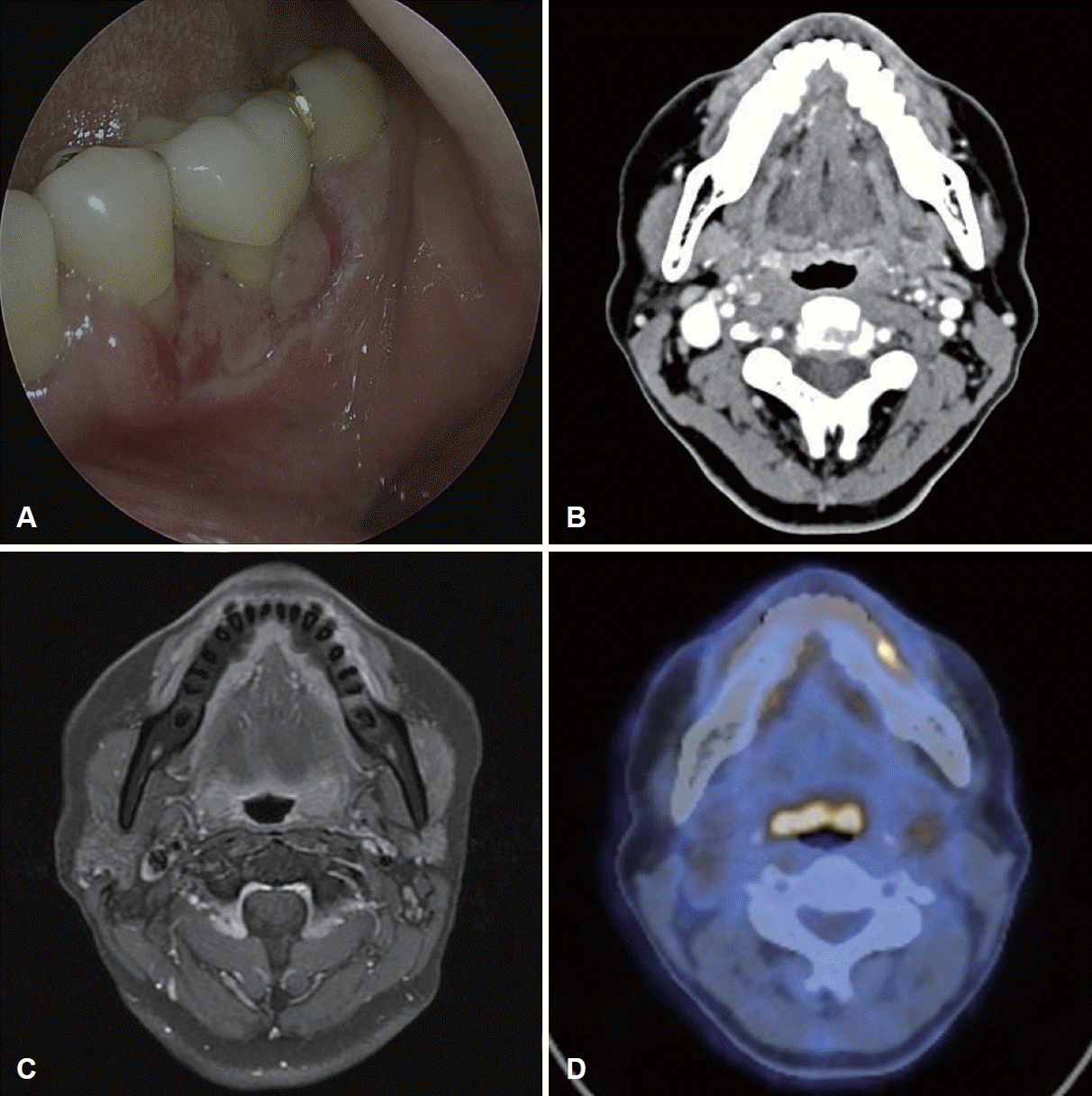
Preoperative evaluation of case 2. A: Preoperative endoscopic examination revealed an ulcerative lesion on the gingiva around the left mandibular molars. B and C: Preoperative neck CT and MRI showed a contrast-enhancing lesion measuring approximately 2.5× 0.5 cm in the left mandible, with no evidence of mandibular bone invasion or abnormal cervical lymph nodes. D: Preoperative positron emission tomography-CT demonstrated increased fluorodeoxyglucose uptake in the left mandible. No other findings suggestive of metastasis were observed.
이에 구강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우선 좌측 경부 I, IIA, III 구역의 선택적 경부절제술(selective neck dissection)을 시행하였고, 광경근하 피판(subplatysmal flap)의 거상을 위쪽으로 더 진행하여 동측의 하악지(mandibular ramus)를 완전히 노출하였다. 이후 변연 하악절제술(marginal mandibulectomy)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구강 내 병변을 일괴(en bloc)로 절제하였다(Fig. 5). 동결절편생검상 절제연에서 종양은 확인되지 않았고, 하악지의 잔여 두께가 1.5 cm 이상 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보강 조치는 시행하지 않았다. 이어서 좌측 전완부에서 피부절제기로 크기 약 5×3.5 cm, 두께 14/1000 inch의 원위부 기반 STSG를 거상하였다. 그리고 동일 부위에서 탈상피화 RFFF를 채취하였고, 전완부의 결손 부위에 거상했던 피부피판을 다시 덮은 후 압박 드레싱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구강의 결손부위를 RFFF를 이용하여 재건한 후, RFFF의 표면에 NeoveilⓇ을 덮고 수술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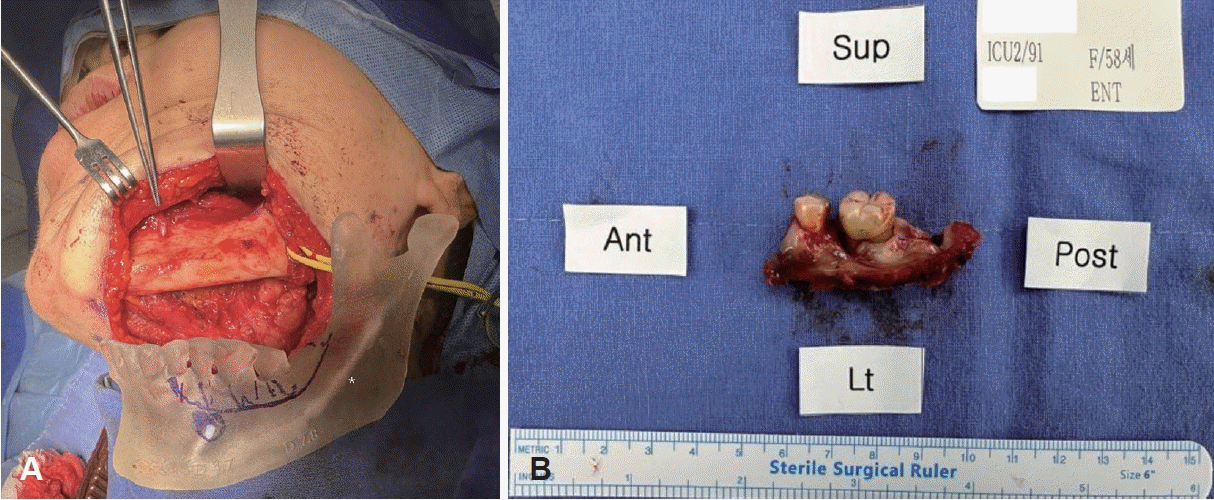
Intraoperative photo of case 2. A: The subplatysmal flap was elevated to completely expose the mandibular ramus. The extent of resection was determined using a 3D-printed model (asterisk) produced before surgery. B: After marginal mandibulectomy, the gingival lesion was resected en bloc.
조직병리검사상 고분화(well-differentiated) 편평상피세포암이 진단되었고, 크기는 1.5×1 cm, DOI 3 mm로 T1에 해당하였다. 절제연, 신경주위, 림프혈관 침범 및 경부 림프절 전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환자는 수술 후 14일째 특이사항 없이 퇴원하였으며, 수술 후 1년 4개월의 경과관찰 동안 전완부의 경미한 구축 외에 합병증은 없었고, 재발 소견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Fig.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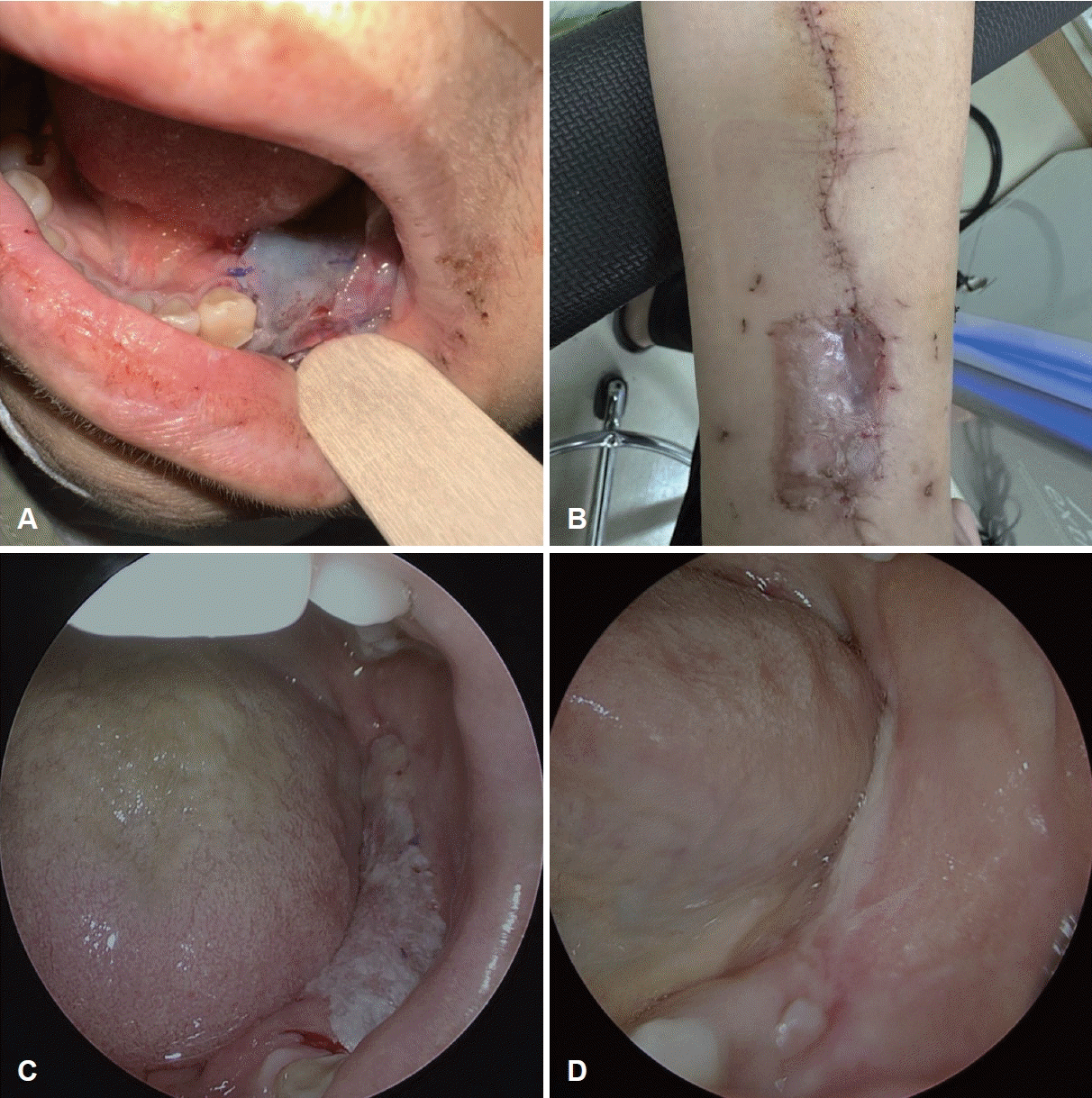
Postoperative findings of case 2. A: On the first day after surgery, the flap was well positioned and showed arterial tint on the pinprick test. B: 14 days after surgery, the sutures in the left forearm were removed, and split-thickness skin graft was well adapted. C and D: At 22 days (C) and 490 days (D) after surgery, the oral reconstruction site is maintained well without recurrence or complications.
고 찰
탈상피화 RFFF는 전완부 결손 부위에 이식할 피부를 서혜부나 하지 등의 다른 부위에서 채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출혈, 흉터, 감염 등의 합병증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른 부위에서 STSG를 이식했을 때보다 색소 침착이나 봉합 자국이 적었고, 전반적으로 흉터의 형태가 더 나았다고 보고된 바 있다[4]. 본 증례에서는 두경부 결손의 재건에 흔히 사용되는 12/1000-14/1000 inch 두께의 STSG를 피부절제기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으며, 탈상피화 RFFF에서 STSG의 채취 성공률은 문헌에 따라 89%-100%로 보고되었다[1,5,6]. 채취에 실패한 경우는 대부분 피부가 연약한 80대 노인에서 STSG 채취 도중 피부가 부서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5]. STSG의 수술 후 합병증은 감염, 피부의 부분 손실, 힘줄의 노출 등이 보고되었으며, 생착 성공률은 문헌에 따라 95%-100%로 보고되었다[1,4-6].
대부분의 문헌에서 탈상피화 RFFF는 구강 결손 부위에 특별한 합병증없이 잘 생착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만 수술 후 체중 감소, 방사선 치료 등의 여러 원인들에 의해 재건 부위가 위축되어 부피가 40%-70%까지 감소할 수 있고, 특히 혀의 경우 이로 인해 연하 및 발성 기능의 재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7-9]. 따라서 구강 결손의 재건을 위해서는 결손 부위의 크기보다 20%-30% 정도 더 크게 피판을 도안해야 한다고 권고되고 있다[9,10]. 특히 STSG의 공여부에 반흔 및 구축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탈상피화 RFFF는 기존의 RFFF 보다 부피 감소가 더 클 수 있어 신중한 도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11]. 한 증례에서는 하악골의 재건에 사용된 금속판(plate)으로 인해 봉합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면서 누공이 형성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 이는 탈상피화에 의한 합병증으로 추정되지는 않지만 하악골의 재건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6]. 또한 피부 채취로 인해 유리피판의 표면에서 지속적인 출혈이 우려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피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바늘 검사(pinprick test)에 방해가 될 정도의 출혈은 없고, 장액혈액성의 분비물은 5일 이내에 호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본 증례에서는 폴리글리콜산(polyglycolic acid) 성분의 시트(sheet) 제제인 NeoveilⓇ로 RFFF의 표면을 덮은 뒤 봉합사로 고정함으로써 출혈의 예방과 2차 치유의 촉진을 도모하였으며, 유리피판은 특이 합병증없이 생착되었다[12]. 다만 초기에 과각질화가 생기는 경향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과각질화는 사라지며, 주변부와 잘 어울리는 색깔과 질감을 보였다. Kawashima 등[6]은 수술 6개월 후 탈상피화 RFFF 부위의 상피를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였을 때, 상피층은 정상 두께로 완전히 회복된 양상으로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STSG 채취 시 잔여 피부에 모낭(hair follicle)이 보존되어 상피의 재생을 촉진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부절제기를 이용하여 17/1000 inch 두께로 STSG를 채취하여도 공여부의 모낭은 보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두경부암 수술 후 절제연이 양성이거나, 암종이 2개 이상의 림프절을 침범하였거나, 피막외 침범이 동반된 경우 등에서 국소 재발 및 원격 전이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술 후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다[13]. 수술 부위가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통상 4-6주가 소요되며, 치유가 완료되는 대로 가능한 빨리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되, 수술 후 방사선 치료까지의 간격이 8주를 넘지 않도록 권고되고 있다[13]. 본 증례에서 두경부 재건에 탈상피화 RFFF를 사용하였지만 출혈 등 합병증없이 신속하게 치유되었으며, 방사선 치료를 지체없이 시행할 수 있었고, 방사선 치료 후에도 재건 부위는 문제없이 잘 회복되었다.
이처럼 두경부암 수술 후 재건 시 탈상피화 RFFF를 이용한다면 다른 부위에서 피부이식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 두경부 재건 부위 또한 합병증없이 잘 회복될 수 있음을 본 증례는 시사하고 있다. 저자들은 탈상피화 RFFF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두경부 재건을 시행한 2예를 치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Notes
Acknowledgments
None
Author Contribution
Conceptualization: Chung Hwan Baek. Data curation: Nayeon Choi. Formal analysis: Heejun Yi. Investigation: Jae-Seon Park. Methodology: Chung Hwan Baek. Project administration: Chung Hwan Baek. Supervision: Nayeon Choi. Validation: Heejun Yi. Visualization: Jae-Seon Park. Writing—original draft: Jae-Seon Park. Writing—review & editing: Heejun Yi, Nayeon Choi, Chung Hwan Ba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