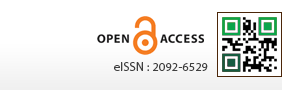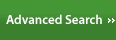서 론
객혈은 혈액이 단독으로 혹은 점액과 함께 객담에 섞여 나오는 것으로, 주로 하기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1]. 객혈은 정도에 따라 가래에 피가 섞여나오는 경우부터 치명적인 출혈까지 다양하게 나뉠 수 있다[2,3]. 객혈의 양에 따라 경증 객혈(<30 mL/24 hr), 중등증 객혈(30-400 mL/24 hr), 대량 객혈(>400 mL/24 hr)로 나뉠 수 있고, 특히 중등증 이상의 객혈이나 반복적 객혈은 출혈 부위뿐만 아니라 객혈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다[4-7]. 대량 객혈의 경우 심장 폐기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조영증강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4-7]. 객혈은 비록 90%에서 자연호전 됨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는 응급상황으로 빠른 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한다[8]. 진단을 위한 첫 단계는 출혈의 기원을 찾는 것으로 철저한 병력청취와 신체검진이 필요하다.
만성적인 객혈을 호소하는 경우, 특히 항생제 치료에 반응이 없고 육안으로 출혈부위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광범위한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만성 객혈을 호소하는 경우 먼저 호흡기 내과를 내원하여 기관지, 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본 증례는 다른 증상 없이 10개월 동안 만성 객혈만을 호소하는 환자가 호흡기내과를 내원하여 시행한 기관지 내시경 검사,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폐기능검사상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아 이비인후과로 전원되었다. 저자들은 비내시경 검사에서 좌측 비인두에서 혈성 농성 분비물을 확인한 후, 비부비동 전산화단층촬영을 통해 좌측 후사골동에 국한된 진균성 부비동염으로 진단하고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여 객혈이 소실된 증례를 경험하였다. 이에 본 증례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본 병원 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면제(2024-12-017)를 받고 수행되었다.
증 례
60세 여자 환자가 약 10개월 전부터 있어온 객혈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객혈의 양상은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가래를 뱉었을 때 피가 섞여 나왔으며 양은 경증 객혈이었다. 10개월 전부터 증상이 시작된 후 특별한 치료는 받지 않았으나 내원 4개월 전부터 양이 증가되어 본원 호흡기내과 내원 전 타 병원에서 객혈에 대하여 급성 세기관지염 의심하에 2주가량 입원하여 cefotaxime, quinolone으로 정맥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을 보이지 않았다. 피가 섞인 객담을 매일 호소하였으며 열이나 오한, 발한, 체중감소, 오심, 배변습관변화, 혈변, 흑색변, 호흡곤란 등은 없었다. 환자는 외상력은 없었으며, 당뇨병, 고혈압, 천식, 협심증 등의 기왕력이 있었으며 내원 당시 당뇨병약, 고혈압약, 진정제 등을 복용하고 있었다. 과거 수술력으로는 자궁절제술과 맹장절제술, 위용종 제거술을 시행받았다.
본원 호흡기 내과 내원 당시 심박수는 78회/min로 균일하였고 혈압은 130/80 mm Hg, 호흡수는 14회/min, 신장은 147 cm, 체중은 60 kg이었다. 호흡기 내과에서 시행한 기본적인 혈액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객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면역질환과 혈관성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시행한 anti-neutrophil cytoplasmic antibody (ANCA)와 rheumatoid factor (RF) 검사에서 음성으로 보고되었다. 객담배양검사에서 세균이나 항산균(acid-fast bacilli, AFB)검사에 음성이었으며 흉부 X-ray, 심전도 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였다.
호흡기내과에서 시행한 기관지 내시경 검사, 폐기능 검사에서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시행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도 객혈원인으로 의심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 기관지 내시경 검사 세척 후 세포검사상 양성 기관지 상피세포와 염증세포로 보고되었고, 결핵균 핵산증폭검사(tuberculosis-polymerase chain reaction), 균배양검사, AFB 검사에서도 음성소견을 보였다.
이후 객혈의 다른 원인 규명을 위해 본원 이비인후과로 전과되었으며, 후두경 검사와 경부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였으나, 두경부 영역에서는 객혈의 명확한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환자는 과거 및 현병력상 비루, 안면통, 만성 비폐색, 만성 기침과 같은 증상은 호소하지 않았다. 비내시경 검사에서 좌측 비인두강에서 피가 섞인 농성 분비물이 관찰되었다(Fig. 1A). 추가적으로 부비동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좌측 후사골동에 국한된 연부조직이 관찰되었으며 연조직음영병변 가운데 흐릿한 석회화 음영이 관찰되었다(Fig. 2).
환자는 당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 예정일 1주일 전에 입원하여 혈당을 조절하고 좌측 내시경 부비동 수술을 시행하였다. 좌측으로 비중격 만곡과 비중격 가시(septal spur)가 관찰되어 내시경하에 비중격 교정을 한 후 좌측 내시경 부비동 수술을 시행하였다. 좌측 후사골동에 흑갈색의 부스러지는 진흙같은 덩어리들이 관찰되었고 염증으로 인해 점막이 많이 비후되어 있었으며 관찰되는 덩어리들을 제거하였다(Fig. 3). 제거된 덩어리는 조직검사상 아스퍼길러스로 진단되었다. 수술 3개월 외래 추적관찰 결과 환자는 객혈을 더 이상 호소하지 않았다(Fig. 1B).
고 찰
객혈은 매우 다양한 원인들로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하기도 질환인 급성 및 만성 기관지염, 결핵, 기관지 확장증, 폐종양과 같은 내과적 질환이 많다. 이밖에도 면역질환이나 혈관성 질환, 외상도 객혈을 일으킬 수 있다. 원인을 밝혀 내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진단학적 검사로 응고인자나 혈소판, 적혈구 수치 등을 확인해야 하며, 염증 여부 확인을 위해 적혈구 침강 비율(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C-반응성 단백(C-reactive protein) 검사와 면역질환, 혈관성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ANCA나 RF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흉부에 대한 영상학적 검사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이나 필요에 따라 전산화단층촬영 혈관 조영술도 필요할 수 있다. 전산화단층촬영으로 출혈 의심 소견이 보이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다. 기관지 내시경 검사는 출혈부위를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검사이다[9,10].
진균성 부비동염은 4개의 범주로 나뉠 수 있다. 공격적으로 조직을 침범하는 급성 전격성형, 만성적이고 비침습적인 만성형, 진균 덩어리와 최소 염증반응을 특징으로 하는 진균종형, 과민반응과 유사한 알레르기형으로 분류된다. 알레르기형은 호산구증가증과 함께 아토피나 천식, 아스피린 과민증 등과 흔히 동반된다.
진균종형인 진균성 부비동염의 약 50%에서 화농성 비루, 37%에서 안면통, 31%에서 만성 비폐색, 14%에서 후비루, 6%에서 만성 기침 등을 주로 호소하게 된다[11]. 하지만 무증상인 경우도 10%가량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진균성 부비동염으로 진단하기 어려워진다[11]. 내원 당시 비내시경에서는 진균덩어리나 화농성 비루, 폴립 등이 관찰될 수 있지만 약 37%에서는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는다[12]. 그래서 추가적인 전산화단층촬영과 자기공명영상촬영이 시행되고 비로소 진균성 부비동염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된다.
진균성 부비동염은 농성 비루, 비폐색, 안면통 등을 주된 증상으로 하며, 객혈은 상대적으로 드문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진균성 부비동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에서는 16%에서 27.3%의 환자들이 혈성 비루 또는 코피를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13,14]. 실제로 부비동 진균구로 인한 객혈 증례는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는데, Fiero 등[15]은 만성 객혈을 유일한 증상으로 내원한 여성 환자의 경우 부비동에 발견된 Pseudallescheria boydii라는 곰팡이 감염이 객혈의 원인임을 밝힌 바 있다. 이 증례는 코피가 아닌 객혈을 유발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본 증례는 객혈이 유일한 주소였던 후방 사골동 진균구 부비동염 환자로, 이러한 점은 원인 불명의 만성 객혈 환자에서 비강 및 부비동 질환, 특히 진균구 부비동염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임상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진균성 부비동염은 상악동에 87.5%, 사골동에 15%, 접형동에 7.5%, 전두동에 2.5%에서 침범하며,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상악동을 침범한 경우 약 68%에서 석회화소견이 관찰된다[12]. 최종적으로 병리검사, 배양검사로 확진할 수 있다. 상악동에서 발생한 진균성 부비동염은 압통 및 코막힘, 농성 비루, 악취를 주로 호소하게 된다. 사골동에서의 진균성 부비동염은 사골동에서만 단독으로 발생되기 보다는 상악동과 인접해 있어 상악동과 사골동에서 진균성 부비동염이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다. 본 증례와 같이 후사골동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는 전체 진균성 부비동염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으나 매우 드문 경우로 생각된다.
본 증례의 경우 코 증상 없이 10개월 동안 만성 객혈만을 호소하는 환자가 호흡기내과를 내원하여 시행한 기관지 내시경 검사,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폐기능 검사상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아 이비인후과로 전원되었다. 환자는 부비동염 증상 없이 유일하게 객혈만 있었기 때문에 우선 호흡기 내과를 방문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진균종형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비동염인 경우 화농성 비루 혹은 후비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피가 섞여 나오지는 않는다. 본 증례는 좌측 후사골동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부비동염의 흔한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환자는 객담에 피가 섞여 나와 화농성 후비루보다는 객혈로 인지하여 우선 호흡기내과에서 검사를 하였으나 객혈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저자들은 비내시경 검사에서 좌측 비인두에서 혈성 농성 분비물을 확인한 후, 비부비동 전산화 단층촬영을 통해 좌측 후사골동에 국한된 진균성 부비동염으로 진단하고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여 객혈이 소실된 증례를 경험하였다. 이에 본 증례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